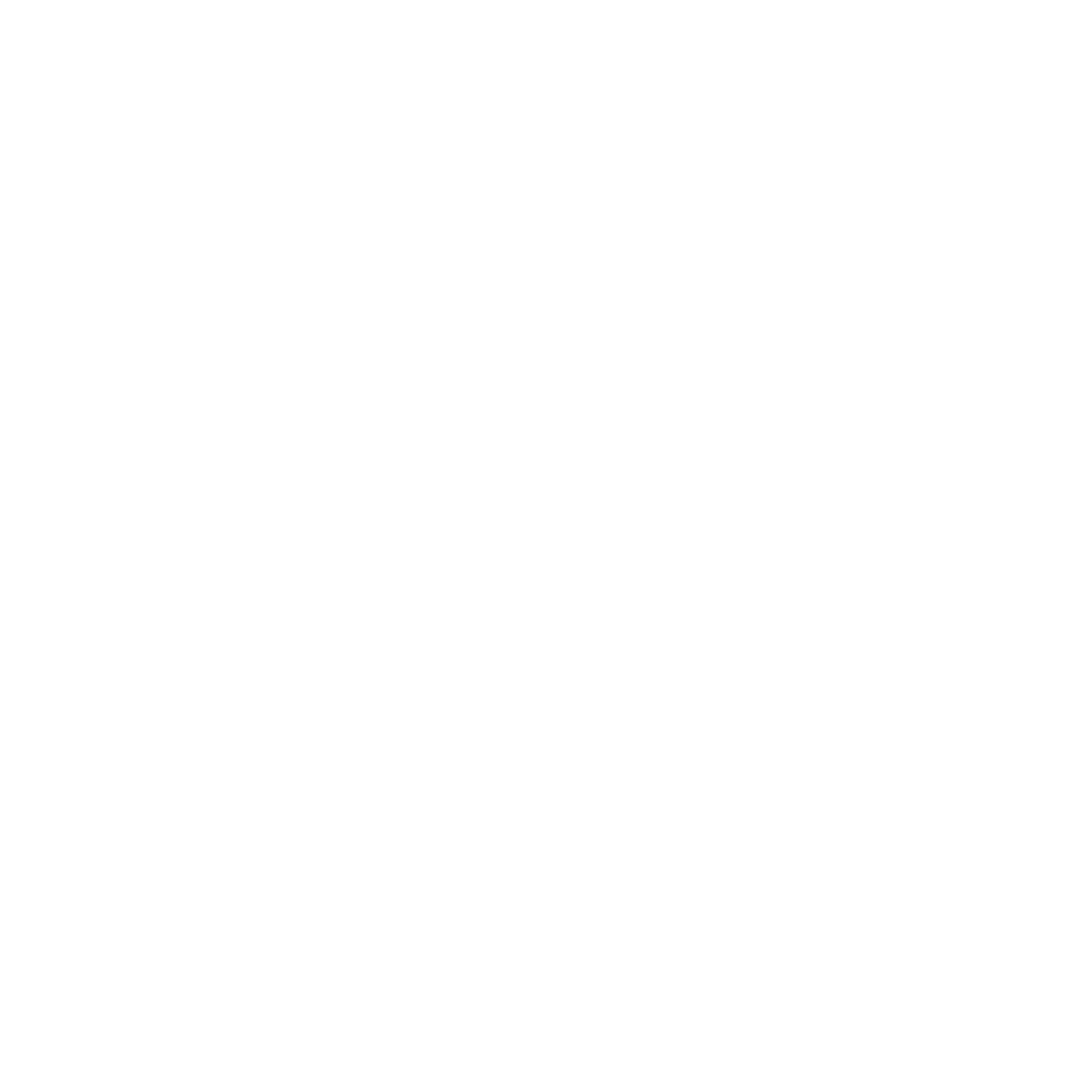2020. 5. 23. 19:39ㆍ잡담
투영(投影) 2
- 두 번째 이야기
1 스탠드 노란 빛의 거울면을 가진 눈 앞의 스탠드 이걸 잠깐 봤는데 좀 웃기게 생긴 노란 내 얼굴이 동그랗게 걸려있었다. 계속 이러저리 움직이며 두 눈 짝을 합해보고 한 짝만 감아보고 거꾸로 매달려도 봤는데 만약 이 스탠드에 눈이 달려있었다면 얘 왜이러나- 하는 눈빛을 보냈을 것이다. 어쨌든 그럴 일은 없을 테니 지금은 내가 이 노란 스탠드의 눈이다.
2 스탠드 전원 버튼을 눌러 켜보았는데 동그랗게 매달려있는 내 얼굴이 더 밝게도 잘 보인다. 불을 켜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아, 이 부분이 코였구나 코의 음영 때문에 경계선 부분이 시커메 보였네 하다가 내 눈동자도 보일까해서 스탠드에 바짝 얼굴을 기울여 보았다. 눈동자에 맺힌 광은 더 잘 보였는데 그러면서 왜인지 더욱 벌어지는 내 입은 아쉽게도 경계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문득 또 다른 분위기가 궁금해져서 이번엔
3 전등 스위치를 눌러 꺼보았다. 그러곤 노란 거울면의 스탠드를 다시 보는데 내 얼굴 형체는 어두운 방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 사라지고 없다. 조명이 닿는 콧등이나 눈두덩이라든지, 살짝 튀어나온 부분들만이 스탠드의 노란 거울면에 맺혀있더라.
4 어떤 날 어떤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의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 스탠드가 떠올랐다. 정확히 말하자면 스탠드의 면에 맺힌 내 얼굴의 상이. 그때의 내 얼굴은 꽤나 평평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얼굴은 눈과 미간을 중심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 얼굴 아래로 내 상반신도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보니 이 사람도 내 눈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있다.
5 다른 이의 눈을 통해 나를 본다는 것이 꽤, 재밌는 경험이다. 이 사람의 눈 반대편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눈이 이리도 투명했었나, 그저 까맣다고만 생각했었던 눈동자가 사실은 그 앞의 대상을 아주 선명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몰입해서 계속 보고 있자면 이것이 눈동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마치 하나의 거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주 투명한 거울. 다채롭고 진한 너의 눈이 나의 상(狀)을 온전하게 갖고 있었다. 또 정신을 차려 보면 이건 단순히 너의 눈동자다. 깜짝 놀라서 얼굴을 뒤로 젖힌다. 흔히 눈동자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들 표현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구나. 눈동자는 확실히 보통의 것이 아니다. 몸의 어디를 둘러 보아도 이것처럼 투명한 반사면을 가진 것이 없다.
6 몸에 차고 있는 것들도 포함한다면, 내 얼굴이 맺혀있는 것들에는 목걸이 같은 것들도 있다. 어제 만난 그 사람이 차고 있던 목걸이의 펜던트는 내 얼굴의 아주 일부를 아주 선명하게 투영시켰다. 또렷하지만 불분명하게도 보이는 것이 내 두 눈으로 파악하기엔 힘들 정도로 이 목걸이의 반사면은 너무 작았다. 계속 쳐다보다간 두 눈 짝이 몰려 하나가 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지는, 목걸이의 반사면보다는 조금 더 널찍한 대신 수많은 금이 처져 있어 내 얼굴을 오히려 더욱 흐릿하게 했다. 시간이 빚어낸 빗금들은 내 눈코입의 형상을 뭉개버렸다. 반지의 반사면에서 나를 알 수 있는 건 오직 피부색과 머리색 뿐이었다.
7 수많은 사람의 눈동자와 사물의 반사면에서 발견한 나의 모습은 모두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다. 내 몸 안에 존재하면서 느끼는 나 자신은 항상 동일한 모습인데 반해, 다른 사물에 맺히는 나의 모습은 늘 같은 적이 없다. 나와 상대가 만나는 순간, 그 시간의 일부를 잘라 내 어떠한 상(狀)으로 박제해놓은, 시간들이 알알이 맺혀있는 그런 반사면. 노란 네 안에서 나는 노랗게 빛났고 둥그런 네 안에서는 부하게 둥그레졌다. 때때로 실제 내 모습보다 선명했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려지기도 하면서.
그런 나를 찾아 수집하는 것은 또 다른 재미다. 나는 한 번도 내가 그려보지 않았던 모습의 나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것들은 대개 만남을 예상하지 못한 얼굴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늘 설레는 것이다. 상대의 눈동자 너머엔 무슨 빛일지 모를 내가 있다. 그 속엔 너를 향한 표정이 있다. 그 표정은 종종 나와 조우한다.
그렇지만 스탠드 속의 내가 노랗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노랗다거나 노래지지는 않는다. 나는 그대로 나다. 왜곡 없는 그대로의 반사면을 통해 나를 처음 만난 그 순간 그대로. 나는 그 모습일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 지금도 너의 눈동자는 나를 더 또렷하게 비춰주고 나의 눈동자 또한 너를 그리 할 것이다. 그거면 된 것이다. 충분히 행복하다. 내가 그 순간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호의를 네가 원하는 깊이의 선만큼 떠다 부어주고 싶을 것이다. 넘치지 않을 정도로 네가 원하는 만큼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원색이 되자.
모든 개체는 각자로 아름다울 때 가장 빛난다. 아름다운 개체들이 만나 서로의 반사면이 되어 상대를 비춘다. 우리는 수많은 다채로운 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빛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색을 알고 그걸 지켜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만남들의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빨간 반사면인 내가 순전히 나의 욕심으로, 파란 너를 빨갛게 만들고자 한다면, 너는 너를 잃고 우리 관계는 그렇게 서서히 서로를 집어삼킬 것이다. 서로의 만남이 서로를 잠식하게 된다면, 결과는 벌써 끔찍하다. 너의 눈빛이 나의 눈빛을 집어삼키지 않고, 서로를 향한 초롱초롱함만이 남은 눈동자를 나는 기대한다.
만약 보라색인 나와 노란색인 네가 새하얀 곳에서 만난다면 혼탁한 회색이 될 것이다. 내가 더욱 선명한 보라색이고 너도 쨍한 노란색일 때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다. 내가 보라색이라고 해서 나는 네가 나와 같은 보랏빛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서로의 상(狀)을 빛내주는 그런 관계가 되자.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학 동안 할 것 (0) | 2020.07.05 |
|---|---|
| 별들의 무게 (0) | 2020.06.12 |
| 투영(投影) (0) | 2020.04.20 |
| 2020년 4월 17일 (0) | 2020.04.17 |
| 가상 공간을 부유하는 쓰레기 (0) |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