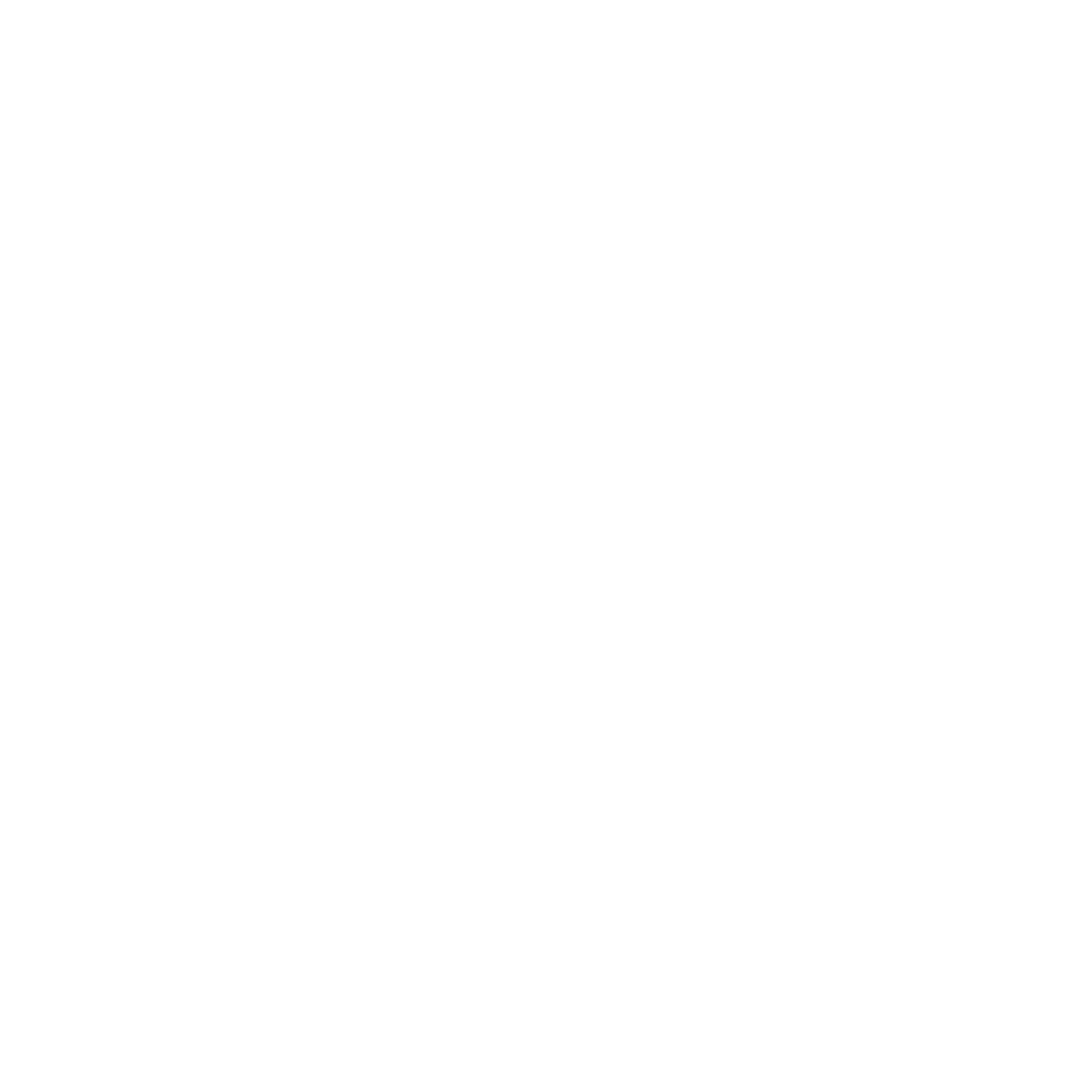2020. 6. 12. 23:02ㆍ잡담
ㅁ
어렸을 때 살던 집 뒷산에 올라가면 현충원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었다. 어두운 초록색의 작은 철문―가시 돋친 철망을 얹은 담을 넘으면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 한 명도 보이고 다시 산의 경사만큼이나 가파른 언덕길을 종종걸음으로 내려가면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밝은 평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늘이 없는 평지라지만, 어찌 이렇게나 밝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해서 다시 그곳을 바라봤을 때가 나와 국립 현충원의 첫 만남의 순간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묘비의 행렬. 하늘보단 땅과 더 가까운 어린 나의 눈높이 탓에 그곳에 있는 묘비의 수는 시골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의 수가 되어 나를 압도했다. 그곳은 별들이 모인 성단만큼이나 환했다. 특히나 매미 울음이 울창한 여름철이 되면 작열하는 태양 빛을 받아 더욱 환해지곤 했다. 그렇게 나는 그 뒤로도 종종 부모님 손을 잡고 뒷산을 오르다가 체력이 허락하는 한 철문 너머 현충원을 걸었고, 해마다 돌아오는 현충원의 사계를 눈에 담아갔다. 봄에는 흐드러진 벚꽃, 여름에는 매미 울음소리만큼이나 선명한 녹음, 가을에는 식욕을 돋우는 붉은 단풍, 그리고 티 없이 하얀, 고요의 눈밭.
국립 현충원의 풍경은 내 유년의 기억 한 구석에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기억의 장면을 문득 6월 6일 현충일, tv 속 실시간 뉴스에서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그 풍경은 단순한 역사의 그림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뒷산 너머 나무 사이로 봤던, 별들처럼 많은 묘비의 수만큼이나 엄청난 무게로 내 어깨를 짓눌렀다. 그동안 풍경에만 집중하느라 그 풍경을 이루는 것들에는 소홀했던 나 자신이 순간 부끄러워졌다. 존재함의 죄의식 같은 것이 무거운 가마니가 되어 어깨 위에 중력을 더했다. 가마니를 이고 이름 모를 가게 앞에 섰다. 많은 이들의 투쟁을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엮고 있는 이 거대한 비극의 간판을 잠깐 내려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는 어쩌면 내가 그동안 외면하고자 했던,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개개인의 숭고한 투쟁들이 가득히 쌓여 있었다. 즉, 이제는 하나의 풍경 속에 자연히 녹아 있어, 귀 기울여 찾지 않으면, 묘비들이 내는 저마다의 목소리는 묻히는 것이었다.
한번은, 학창 시절 내내 해왔던 묘지 정화 봉사활동을,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하지 않다가, 우연히 다시 참여해 볼 기회가 있었다.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이라 그런지 어린 시절의 나와 같은 나잇대인 어린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다. 맞아 나도 그때는 같이 온 친구랑 하하 호호 웃고 떠들면서 했었지―하는 짧은 회상과 함께 아이들의 대화 소리를 병풍 삼아 들으며 묘비를 닦고 화병의 물을 비워냈다. 묘비 하나하나를, 아니,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닦아내며 그들의 삶을 떠올렸다. 이념을 내세운 거대한 투쟁에 가려 책이나 종이 한 쪼가리의 어떠한 기록으로도 남지 못한 김oo의 삶. 살아 당시 이름 세 글자조차도 거두지 못하고 떠난 신원 미상의 그. 당신의 삶을 온전한 정신으로 미처 끝맺기도 전에 먼지 한 줌으로 허공에 흩뿌려진, 옆, 그 옆, 또 그 옆으로 방을 내어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그들의 삶. 당신의 삶은 어땠나요― 영원히 침묵하고 있는 그들 위에서 나는 답 없는 질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잠깐 손걸레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화병에 꽂혀있는 조화를 들어냈다. 고여있는 물 위로 작은 파동이 그려졌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라면, 그는 간밤에 내린 비를 그가 가진 슬픔의 깊이만큼 가두어 담아놓고 있었나 보다. 당신은 무엇을 그리도 절실히 지키고자 했나요―
이미 지나간 투쟁의 흔적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 비석 위의 먼지를 닦아내고, 주변의 잡초를 뽑아내며, 고여있는 슬픔에 잠식되지 않도록, 남은 이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 한순간에 저물어버린 파편 같은 작은 별들을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추모할 수 있을까. 죽어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고작 두세 걸음 남짓의 폭이지만, 땅 아래로 꺼진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다시 손걸레를 집어 들었다.
지금도 나는 현충일 사이렌이 생생히 들려오는 반경 안의 지역에 살고 있다. 사이렌이 들릴 때면 나는 고개를 숙여 그 작은 철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곤 한다.
ㅁ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1018 업무 일지 (0) | 2020.10.18 |
|---|---|
| 방학 동안 할 것 (0) | 2020.07.05 |
| 투영(投影) 2 (0) | 2020.05.23 |
| 투영(投影) (0) | 2020.04.20 |
| 2020년 4월 17일 (0) | 2020.04.17 |